
의학 / 영양학
현미껍질의 재발견… ‘장 건강’ 지키는 도우미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5.10.15
SGLAB
현미껍질을 섭취 가능하게 가공… 분말-차 등 ‘조강바이오틱스’ 개발
유익균이 장에서 잘 정착하게 도와… SGLAB “인간 수명연장이 목표”
현미껍질을 섭취 가능하게 가공… 분말-차 등 ‘조강바이오틱스’ 개발
유익균이 장에서 잘 정착하게 도와… SGLAB “인간 수명연장이 목표”
SGLAB(장살림연구소) 개발 전체제품군 진열대. SGLAB 제공
현대 의학이 주목하는 새로운 키워드 중 하나는 ‘장내 미생물’이다. 불과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미생물은 단순히 소화기관 속에 있는 부수적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이 면역 체계, 대사질환, 뇌 신경계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장내 환경이 곧 인체 전반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이 점차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현미껍질의 재발견
현미껍질섬유소와 프락토올리고당 혼합제품
국내에서는 ‘SGLAB(장살림연구소)’이 이 분야 연구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다. SGLAB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야 유익균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특히 프리바이오틱스 개념을 적극 도입해 단순히 유산균을 보충하는 차원을 넘어 유익균이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SGLAB이 선택한 핵심 소재는 현미껍질이였다. 오랫동안 부산물로 취급돼왔던 현미껍질은 풍부한 섬유소와 항산화 성분, 미네랄을 함유해 장내 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다만 섬유소가 매우 단단한 고분자 형태여서 소와 같은 반추동물 외에는 활용하기 어려웠다.현미껍질섬유소를 유산균으로 발효한 제품
이를 해결하기 위해 SGLAB은 현미껍질을 고온증숙 공정을 통해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섬유소로 가공한 ‘조강바이오틱스’ 제품군을 개발했다. 특허등록된 이 기술은 분말·과립·차 등 다양한 제형으로 선보여 소비자가 일상에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학술적 근거도 충분하다. 장내 미생물이 섬유소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단쇄지방산(SCFA)은 장벽 상피세포의 영양원이 되고 염증을 억제하며 비만·당뇨병 같은 대사질환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다수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는 조강바이오틱스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120세 건강 수명 도전
식사대용식으로 만든 위밥
SGLAB은 장내 미생물 활성화를 통해 인간의 건강 수명을 120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다소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장내 균총이 면역·대사·정신 건강 전반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허황된 주장은 아니다. 실제로 노화 과정 자체가 장내 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식사대용식으로 만든 위밥
정윤화 단국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장내에서 잘 정착하고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돼 장내 생태계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꾸준한 섭취는 건강한 장내 환경 조성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장내 미생물 연구가 개인 건강을 넘어 사회적·산업적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건강 수명은 개인 삶의 질뿐 아니라 국가적 의료비 부담과 직결된다.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기능성 식품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대안이자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다. 글로벌 시장은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연간 50만 t이 생산되는 현미껍질이 국민 건강 증진의 촉매제로 활용된다면 초고령사회 극복의 획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
SGLAB의 도전은 의료와 식품 산업의 경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장내 미생물이라는 미시적 세계를 조율하는 일이 인류 장기 건강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은 단순한 소화 기능 차원을 넘어 인구절벽 시대 장수를 누리며 경제활동 연령을 연장하는 해법으로 이어진다. 장내 미생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연구 대상이며 조강바이오틱스를 비롯한 다양한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은 국민 건강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작은 움직임이 세계적 건강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지현 기자 kinnjh@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인기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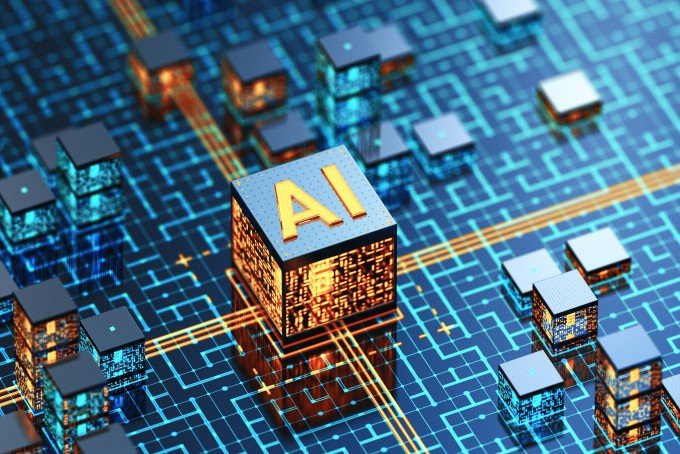

![[K-TECH 글로벌 리더스] 〈삼성전자②〉AI 핵심 플레이어로 돌아온 삼성전자… ‘기술 초격차’ 재현할까](/upload_dir/kfocus/2026/02/20260203.133283218.1_1770340202_69853f6aaca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