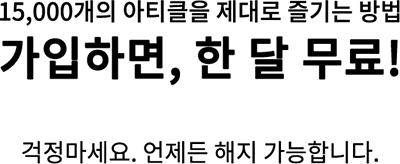주역에서 배우는 경영
주역에서 말하는 경영의 핵심은 소통
Article at a Glance
『주역』은 중국 신화시대 3황5제 가운데 한 사람인 복희씨가 고안했다고 전해진다. 복희씨에겐 삼라만상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표시할 기호 체계가 필요했다. 내일 날씨가 어떨지, 비바람이나 우레가 칠 것인지 등을 예측할 수 있어야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국가 경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 물(☵)과 불(☲), 산(☶)과 연못(☱), 우레(☳)와 바람(☴) 등 대표적인 자연현상 여덟 가지를 기호(상징체계)로 그렸다. 이것이 『주역』의 기초인 8괘다. 결국 『주역』의 출발은 경영이었던 셈이다. 『주역』에서 말하는 경영의 핵심은 소통이다. 『주역』에서 땅을 상징하는 곤괘(☷)가 위에, 하늘을 상징하는 건괘(☰)가 아래에 놓여 있는 지천태괘()가 태평성대를 뜻하는 것도 임금이 가장 높은 자리인 하늘을 백성들에게 내주고 자신은 가장 낮은 자리인 땅에 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양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동양사상의 최고봉으로 여겨지는 『주역』은 그 출발이 경영이었다. 다소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주역』의 연원을 추적하다 보면 이런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한다.
『주역』은 중국 신화시대의 복희씨가 처음으로 고안했다고 전해진다. 복희씨는 하늘(☰)과 땅(☷), 물(☵)과 불(☲), 산(☶)과 연못(☱), 우레(☳)와 바람(☴) 등 대표적인 자연현상 여덟 가지를 기호(상징체계)로 그렸는데 이것이 『주역』의 기초인 8괘다. 주나라의 문왕은 이 8괘를 아래위로 중첩시켜 64개(8*8=64)의 복합 괘를 만든 후 각각의 괘에 이름을 붙였고, 주공은 괘를 구성하는 단위 요소인 효(爻)에 의미를 부여했다. 전자를 괘사(卦辭), 후자를 효사(爻辭)라 한다. 괘사와 효사는 뒤에 붙은 사(辭)라는 글자가 말해주듯이 각각의 괘와 효에 담긴 메시지, 의미 체계를 뜻한다. 『주역』 공부나 주역점의 성패는 괘사와 효사를 삼라만상의 운행원리와 시공간의 변화에 맞게 얼마나 적절하게 잘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주역과 경영의 관계
복희씨와 문왕이 괘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주역』과 경영의 관계를 추론해낼 수 있다. 두 문건은 모두 강(江), 즉 치수(治水)와 관련이 있다. 하도의 하(河)는 황하강을 뜻하고, 낙서의 낙(洛)은 황하강의 지류인 낙수를 뜻한다. 고대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강물을 끼고 있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강물은 인류가 원시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적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다. 수량이 풍부해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었고, 농산물의 수확량에 비례해서 거두는 세금은 고대국가의 경제적 원천이었다.
문제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강물의 범람이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홍수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는데 문명의 태동기인 기원전 3000년경의 사정은 오죽했겠는가. 강물이 범람하면 농사를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의 경계가 흐릿해져 소유권 분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국가는 국가대로 애로사항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이다. 세금을 징수하는 기준과 근거, 대상이 뒤죽박죽됐을 것이고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8괘를 고안했다는 복희씨는 중국 신화시대의 3황5제 가운데 한 사람이다. 즉,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였던 셈이다. 그에게는 세금을 징수해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책임이 있었다. 그래서 언제, 어떤 형태로 홍수가 닥칠 것인지를 예측하고, 범람한 강물로 인해 흐릿해진 토지의 경계를 복원해 과세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국가적 과제였다.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일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심해져 하루도 못 버티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을 것이다.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시기, 별자리의 운행 등을 면밀하게 관측해서 과학적인 역법(曆法) 체계를 갖추는 것이 최선이었다. 한자 역(曆)자를 파자해 보면 벼화(禾) 자가 두 개 있고, 그 밑에 날 일(日) 자가 있는데 고대의 역법이 왜 생겼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농사를 짓기에 적당한 날짜를 일러주는 것이 바로 역법이다.
『주역』도 이런 필요에서 시작된 것이다. 복희씨에게는 역법 체계와 함께 삼라만상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표시할 기호 체계가 필요했다. 내일은 날씨가 맑을 것인지, 아니면 비가 올 것인지, 바람이 불 것인지, 우레가 칠 것인지 등을 예측할 수 있어야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국가 경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황하에서 발견된 하도는 이런 기호 체계를 설계하는 밑그림이 됐다. 하도에는 1부터 10까지의 수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 동서남북 사방에 걸쳐 순환적 배열 구도로 그려져 있다. 복희씨는 이에 착안해 자연 만물의 순환 원리를 여덟 개의 기호로 그렸는데 이것이 『주역』의 기초가 되는 8괘다.
하나라 시대의 우임금이 발견했다고 전해지는 낙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우임금이 치수를 잘해 왕이 됐다고 말한다. 우임금은 낙서에 표기된 다이어그램의 수학적 원리를 치수와 국가 경영에 적절하게 응용해 성공한 지도자가 됐으며, 훗날 주나라의 문왕은 낙서와 우임금의 경영 사례를 참고해 『주역』의 64괘를 그렸다.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뒤 글자 두 개를 따서 도서관이라는 용어가 생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문건은 학문의 모태이기도 하다. 하도의 다이어그램을 구성하는 수의 합계가 55이고, 낙서의 다이어그램을 구성하는 수의 합계가 45인데 이 둘을 합하면 만물의 완성을 뜻하는 1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하도와 낙서를 토대로 설계된 『주역』을 학문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역』은 중국 신화시대 3황5제 가운데 한 사람인 복희씨가 고안했다고 전해진다. 복희씨에겐 삼라만상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표시할 기호 체계가 필요했다. 내일 날씨가 어떨지, 비바람이나 우레가 칠 것인지 등을 예측할 수 있어야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국가 경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 물(☵)과 불(☲), 산(☶)과 연못(☱), 우레(☳)와 바람(☴) 등 대표적인 자연현상 여덟 가지를 기호(상징체계)로 그렸다. 이것이 『주역』의 기초인 8괘다. 결국 『주역』의 출발은 경영이었던 셈이다. 『주역』에서 말하는 경영의 핵심은 소통이다. 『주역』에서 땅을 상징하는 곤괘(☷)가 위에, 하늘을 상징하는 건괘(☰)가 아래에 놓여 있는 지천태괘()가 태평성대를 뜻하는 것도 임금이 가장 높은 자리인 하늘을 백성들에게 내주고 자신은 가장 낮은 자리인 땅에 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양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 편집자주 노자와 장자 사상에 천착해 온 박영규 인문학자가 이번엔 『주역』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역대 중국 황제들은 물론이고 조선의 임금들도 탐독해왔던 『주역』을 통해 현대 기업 경영에의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
동양사상의 최고봉으로 여겨지는 『주역』은 그 출발이 경영이었다. 다소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주역』의 연원을 추적하다 보면 이런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한다.
『주역』은 중국 신화시대의 복희씨가 처음으로 고안했다고 전해진다. 복희씨는 하늘(☰)과 땅(☷), 물(☵)과 불(☲), 산(☶)과 연못(☱), 우레(☳)와 바람(☴) 등 대표적인 자연현상 여덟 가지를 기호(상징체계)로 그렸는데 이것이 『주역』의 기초인 8괘다. 주나라의 문왕은 이 8괘를 아래위로 중첩시켜 64개(8*8=64)의 복합 괘를 만든 후 각각의 괘에 이름을 붙였고, 주공은 괘를 구성하는 단위 요소인 효(爻)에 의미를 부여했다. 전자를 괘사(卦辭), 후자를 효사(爻辭)라 한다. 괘사와 효사는 뒤에 붙은 사(辭)라는 글자가 말해주듯이 각각의 괘와 효에 담긴 메시지, 의미 체계를 뜻한다. 『주역』 공부나 주역점의 성패는 괘사와 효사를 삼라만상의 운행원리와 시공간의 변화에 맞게 얼마나 적절하게 잘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주역과 경영의 관계
복희씨와 문왕이 괘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주역』과 경영의 관계를 추론해낼 수 있다. 두 문건은 모두 강(江), 즉 치수(治水)와 관련이 있다. 하도의 하(河)는 황하강을 뜻하고, 낙서의 낙(洛)은 황하강의 지류인 낙수를 뜻한다. 고대문명의 발상지가 모두 강물을 끼고 있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강물은 인류가 원시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적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다. 수량이 풍부해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었고, 농산물의 수확량에 비례해서 거두는 세금은 고대국가의 경제적 원천이었다.
문제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강물의 범람이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홍수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는데 문명의 태동기인 기원전 3000년경의 사정은 오죽했겠는가. 강물이 범람하면 농사를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의 경계가 흐릿해져 소유권 분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국가는 국가대로 애로사항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이다. 세금을 징수하는 기준과 근거, 대상이 뒤죽박죽됐을 것이고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8괘를 고안했다는 복희씨는 중국 신화시대의 3황5제 가운데 한 사람이다. 즉,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였던 셈이다. 그에게는 세금을 징수해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책임이 있었다. 그래서 언제, 어떤 형태로 홍수가 닥칠 것인지를 예측하고, 범람한 강물로 인해 흐릿해진 토지의 경계를 복원해 과세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국가적 과제였다.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일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심해져 하루도 못 버티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을 것이다.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시기, 별자리의 운행 등을 면밀하게 관측해서 과학적인 역법(曆法) 체계를 갖추는 것이 최선이었다. 한자 역(曆)자를 파자해 보면 벼화(禾) 자가 두 개 있고, 그 밑에 날 일(日) 자가 있는데 고대의 역법이 왜 생겼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농사를 짓기에 적당한 날짜를 일러주는 것이 바로 역법이다.
『주역』도 이런 필요에서 시작된 것이다. 복희씨에게는 역법 체계와 함께 삼라만상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표시할 기호 체계가 필요했다. 내일은 날씨가 맑을 것인지, 아니면 비가 올 것인지, 바람이 불 것인지, 우레가 칠 것인지 등을 예측할 수 있어야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국가 경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황하에서 발견된 하도는 이런 기호 체계를 설계하는 밑그림이 됐다. 하도에는 1부터 10까지의 수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 동서남북 사방에 걸쳐 순환적 배열 구도로 그려져 있다. 복희씨는 이에 착안해 자연 만물의 순환 원리를 여덟 개의 기호로 그렸는데 이것이 『주역』의 기초가 되는 8괘다.
하나라 시대의 우임금이 발견했다고 전해지는 낙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우임금이 치수를 잘해 왕이 됐다고 말한다. 우임금은 낙서에 표기된 다이어그램의 수학적 원리를 치수와 국가 경영에 적절하게 응용해 성공한 지도자가 됐으며, 훗날 주나라의 문왕은 낙서와 우임금의 경영 사례를 참고해 『주역』의 64괘를 그렸다.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뒤 글자 두 개를 따서 도서관이라는 용어가 생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문건은 학문의 모태이기도 하다. 하도의 다이어그램을 구성하는 수의 합계가 55이고, 낙서의 다이어그램을 구성하는 수의 합계가 45인데 이 둘을 합하면 만물의 완성을 뜻하는 1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하도와 낙서를 토대로 설계된 『주역』을 학문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기기사
회원 가입만 해도, DBR 월정액 서비스 첫 달 무료!
15,000여 건의 DBR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