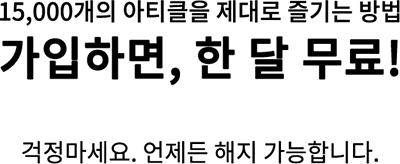생각의 형성
“좋은 생각 없어?”라는 말 넘치는 세상. 생각의 달인은 고전에 있더라
Article at a Glance
생전에 ‘상갓집의 개’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공자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뭐라도 하려고 한다’는 뜻의 지기불가이위(知其不可而爲)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쓰러졌다가도 금방 다시 일어나길 반복했고, 그 지난한 실패의 과정을 견뎌냈기에 사회현상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대안을 찾아내는 ‘생각의 기획자’가 될 수 있었다. 생각이 최종적으로 형상화되기까지 종종 답답하고, 갑갑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공자처럼 안 되더라도 다시, 또다시 노력할 때 수만 갈래의 생각 소(素) 중 일부가 결국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G20에 참가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 한국전쟁으로 전국토가 폐허가 됐던 상황을 고려하면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산업 분야도 선진국의 제품을 모방해서 수출하던 단계를 벗어나서 첨단 제품을 고안하고 개발해야 살아남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있던 것을 모방하던 수준에서 없는 것을 기획해야 하는 수준에 이른 셈이다. 주변에 “뭐 좋은 생각 없어?”라고 질문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생각 좀 합시다”라는 말이 빈번하게 들린다. 이제 더 이상 생각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이 아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의 지위를 지키기 어렵게 된 것이다. 생각이 귀찮다고 나 몰라라 하는 일은 더 이상 애교로 봐줄 수도 없게 됐다. 바야흐로 ‘생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생각의 의미와 조건
그렇다면 도대체 ‘생각’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이야기하려면 그 의미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고려하고 있으면 같은 말이라도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에는 일단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그리워하다는 뜻이 있다. 또 잊는다고 하면서 잊지 못하고 계속 미련을 두다는 뜻도 있다. 하지만 이런 감정 맥락의 생각은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각자 알아서 할 사항이지 공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생각’은 바로 바뀌는 현상들 중에서 어떤 일관된 흐름을 포착해 형상화와 개념화를 해내고 다양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정신적 활동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생각’이라고 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어려워한다.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쭉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다양한 요소를 비교하며, 장단점을 나누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론화하고 북한 핵문제를 푸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반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만지고 느끼는 대상이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쉽다고 여긴다. 단일한 대상에 대한 짧은 시간에 느낀 것을 말하자니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뜨거운 걸 뜨겁다고 하고, 시원한 생맥주가 맛있다고 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학생들에게 여기저기 자료를 편집하는 졸업논문보다는 차라리 인문 사회 또는 자연과학의 교양 주제를 제시하고 A4 용지 3∼5장 분량으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고 종종 이야기한다. A4 용지 3∼5장은 1∼2분 머리를 짜내서 채울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 적어도 상당한 시간에 걸쳐 생각을 정리하고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작성해야 하는 긴 분량이다. 이렇게 30분 이상씩 생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면 홀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예사롭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정리할 10분의 시간을 가진 뒤 원고 없이 5∼10분 발표를 해보는 것도 좋다. 생각을 정리하고 노트 없이 조리 있게 말한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글쓰기와 말하기는 누구에게 의존할 수 없고 오로지 자신의 기억과 정리한 학습을 바탕으로 쉬지 않고 생각을 이어가는 것이다. 외운 것을 받아쓰거나 읊조리는 것이 아닌 이러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한다면 실용적이든, 전문적이든 의제가 제시됐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의제의 논전을 뽑아내고 대안과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것이 생각을 잘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생각을 잘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17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적으로 40만 부 이상이 팔린 스테디셀러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의 사례에서 여실히 알 수 있듯이 축소를 통해 전체를 통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만약 지구에 100명이 산다면’으로 가정해 살펴보면 63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전체 지구의 모습이 한눈에 확 들어온다. 남자가 48명이면 여성이 52명으로 4%가량이 많고 어린이가 30명이면 어른 70명으로 후자가 두 배 이상이다. 몇억에 달하는 큰 숫자를 말하려면 발언하기도 쉽지 않고 정확하게 외우기도 쉽지 않다. 대신 축약하면 전체 숫자를 장악해 큰 그림을 그리기가 한결 쉽다.
다음으로 사고의 규칙을 지켜가면서 판단(判斷)을 내리고, 일단 판단을 내리면 과단성 있게 추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판단의 한자를 살펴보면 칼과 도끼가 의미의 요소로 들어가 있다. 판단은 이처럼 앞서 진행해온 생각의 흐름을 끊고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흘러 사고의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사고의 규칙을 지키고도 제때에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늘 생각 중이되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기업 CEO의 경우, 중요 정책을 판단하지 못해 기업 전체가 올 스톱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판단은 모두 문제이므로 적실한 판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자도 너무 여러 차례 생각을 뒤집는 사람에게 “두 번 정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의 재사가의(再思可矣)를 강조하기도 했다.
생전에 ‘상갓집의 개’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공자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뭐라도 하려고 한다’는 뜻의 지기불가이위(知其不可而爲)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쓰러졌다가도 금방 다시 일어나길 반복했고, 그 지난한 실패의 과정을 견뎌냈기에 사회현상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대안을 찾아내는 ‘생각의 기획자’가 될 수 있었다. 생각이 최종적으로 형상화되기까지 종종 답답하고, 갑갑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공자처럼 안 되더라도 다시, 또다시 노력할 때 수만 갈래의 생각 소(素) 중 일부가 결국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G20에 참가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 한국전쟁으로 전국토가 폐허가 됐던 상황을 고려하면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산업 분야도 선진국의 제품을 모방해서 수출하던 단계를 벗어나서 첨단 제품을 고안하고 개발해야 살아남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있던 것을 모방하던 수준에서 없는 것을 기획해야 하는 수준에 이른 셈이다. 주변에 “뭐 좋은 생각 없어?”라고 질문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생각 좀 합시다”라는 말이 빈번하게 들린다. 이제 더 이상 생각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이 아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의 지위를 지키기 어렵게 된 것이다. 생각이 귀찮다고 나 몰라라 하는 일은 더 이상 애교로 봐줄 수도 없게 됐다. 바야흐로 ‘생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생각의 의미와 조건
그렇다면 도대체 ‘생각’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이야기하려면 그 의미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고려하고 있으면 같은 말이라도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에는 일단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그리워하다는 뜻이 있다. 또 잊는다고 하면서 잊지 못하고 계속 미련을 두다는 뜻도 있다. 하지만 이런 감정 맥락의 생각은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각자 알아서 할 사항이지 공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생각’은 바로 바뀌는 현상들 중에서 어떤 일관된 흐름을 포착해 형상화와 개념화를 해내고 다양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정신적 활동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생각’이라고 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어려워한다.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쭉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다양한 요소를 비교하며, 장단점을 나누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론화하고 북한 핵문제를 푸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반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만지고 느끼는 대상이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쉽다고 여긴다. 단일한 대상에 대한 짧은 시간에 느낀 것을 말하자니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뜨거운 걸 뜨겁다고 하고, 시원한 생맥주가 맛있다고 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학생들에게 여기저기 자료를 편집하는 졸업논문보다는 차라리 인문 사회 또는 자연과학의 교양 주제를 제시하고 A4 용지 3∼5장 분량으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고 종종 이야기한다. A4 용지 3∼5장은 1∼2분 머리를 짜내서 채울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 적어도 상당한 시간에 걸쳐 생각을 정리하고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작성해야 하는 긴 분량이다. 이렇게 30분 이상씩 생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면 홀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예사롭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정리할 10분의 시간을 가진 뒤 원고 없이 5∼10분 발표를 해보는 것도 좋다. 생각을 정리하고 노트 없이 조리 있게 말한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글쓰기와 말하기는 누구에게 의존할 수 없고 오로지 자신의 기억과 정리한 학습을 바탕으로 쉬지 않고 생각을 이어가는 것이다. 외운 것을 받아쓰거나 읊조리는 것이 아닌 이러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한다면 실용적이든, 전문적이든 의제가 제시됐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의제의 논전을 뽑아내고 대안과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것이 생각을 잘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생각을 잘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17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적으로 40만 부 이상이 팔린 스테디셀러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의 사례에서 여실히 알 수 있듯이 축소를 통해 전체를 통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만약 지구에 100명이 산다면’으로 가정해 살펴보면 63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전체 지구의 모습이 한눈에 확 들어온다. 남자가 48명이면 여성이 52명으로 4%가량이 많고 어린이가 30명이면 어른 70명으로 후자가 두 배 이상이다. 몇억에 달하는 큰 숫자를 말하려면 발언하기도 쉽지 않고 정확하게 외우기도 쉽지 않다. 대신 축약하면 전체 숫자를 장악해 큰 그림을 그리기가 한결 쉽다.
다음으로 사고의 규칙을 지켜가면서 판단(判斷)을 내리고, 일단 판단을 내리면 과단성 있게 추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판단의 한자를 살펴보면 칼과 도끼가 의미의 요소로 들어가 있다. 판단은 이처럼 앞서 진행해온 생각의 흐름을 끊고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흘러 사고의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사고의 규칙을 지키고도 제때에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늘 생각 중이되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기업 CEO의 경우, 중요 정책을 판단하지 못해 기업 전체가 올 스톱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판단은 모두 문제이므로 적실한 판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자도 너무 여러 차례 생각을 뒤집는 사람에게 “두 번 정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의 재사가의(再思可矣)를 강조하기도 했다.
인기기사
회원 가입만 해도, DBR 월정액 서비스 첫 달 무료!
15,000여 건의 DBR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세요.